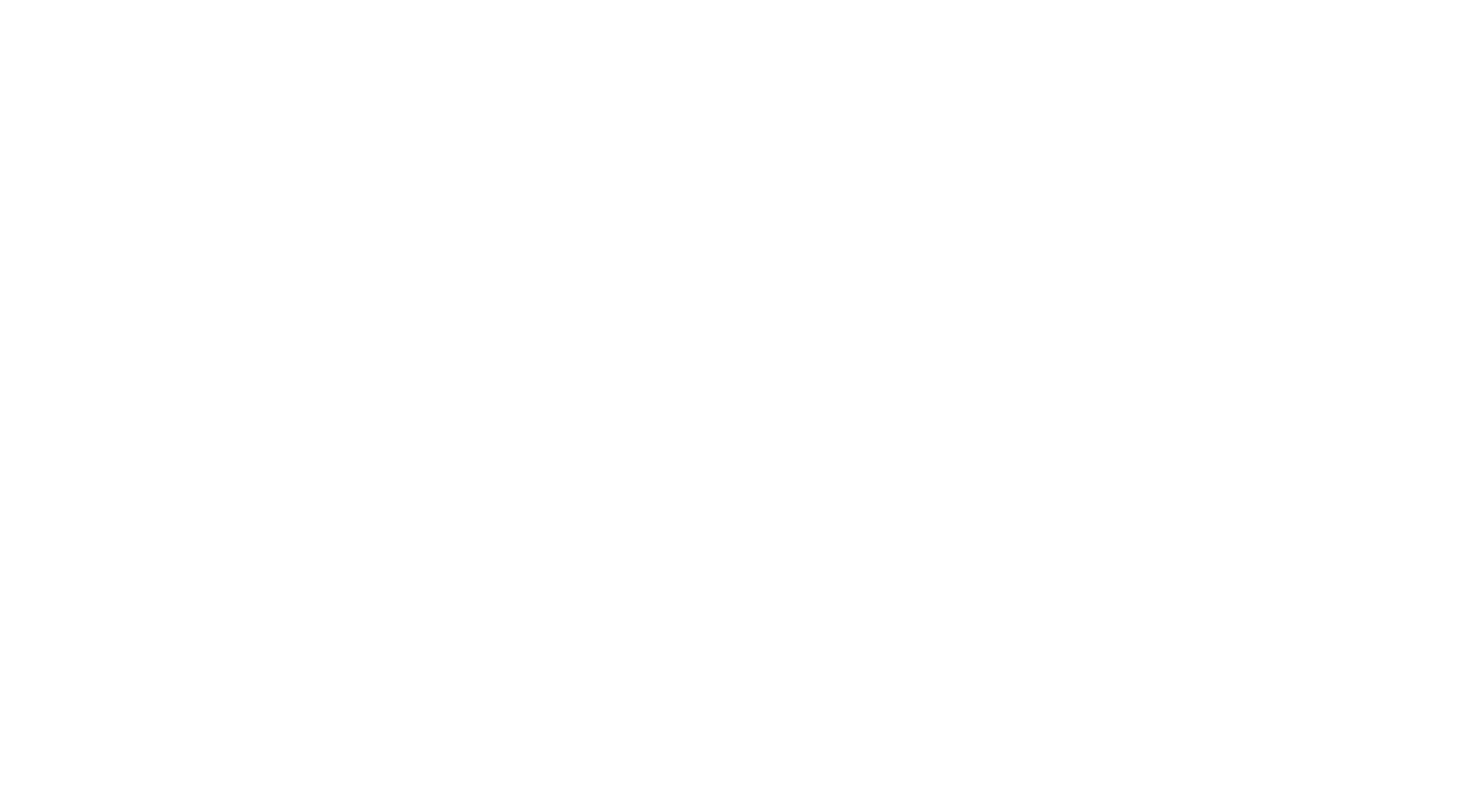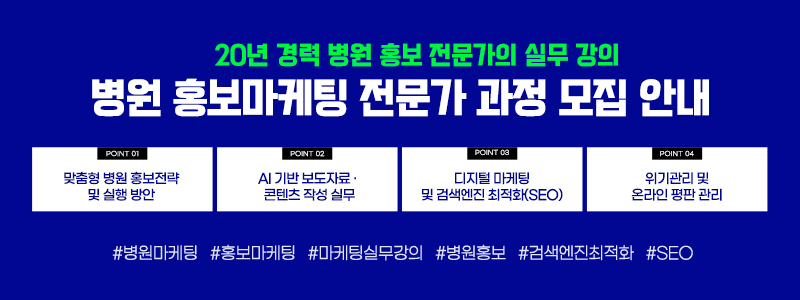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구분된다. 그중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55~70%를 차지하며 가장 흔하다.
강동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는 원인이 명확한 경우 치료로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 전체 치매 환자의 10~15%는 완치도 기대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아직 완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비정상적으로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퇴행성 질환이다. 이로 인해 기억력과 언어 능력 등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심하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진다.
발병 원인은 신경계 노화,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널리 쓰이는 치료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로, 뇌 속 아세틸콜린 분해를 막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춘다. 국내에서는 경구용과 패치형 치료제가 있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강동우 교수는 "최근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비정상 단백질을 항체로 제거하는 면역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이는 주로 초기 환자에게 적용되며, 질병 진행을 늦추는 데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사질환, 우울증, 음주, 흡연 같은 위험 인자를 조기 관리하고, 신체 활동과 인지 자극,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예방과 진행 억제에 필수적이다.

치매 초기에는 인지 기능의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물건 위치를 자주 잊거나 약속을 반복해서 잊는 경우,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망증과 달리 치매는 단서를 줘도 기억이 떠오르지 않고 증상이 점차 심해진다. 감정 조절 어려움, 갑작스러운 공격성, 무기력 등 정서 변화도 초기 신호다.
강 교수는 "치매는 진단만 받으면 끝나는 병이 아니다.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치료 목표는 기능 저하 속도를 정상 노화 수준으로 늦추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 의료진의 진료, 그리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